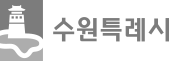수강신청
- 홈
- 수강신청
- 수강후기
수강후기
길 위의 학교 후기-기어코 다시 봄
- 작성자
- 마영미
- 작성일
- 2014.04.08
- 조회수
- 6240/1

<길 위의 학교 후기> 기어코 다시 봄
아파트에 일주일 마다 서는 장에서 구입한 라일락 묘목을 화분에 옮겨 심었다. 여릿여릿한 가지 사이로 꽃망울이 맺히더니 툭툭 앙증맞은 꽃잎이 터졌다. 결코 곁을 허락할 것 같지 않던 겨울의 땅을 뚫고 연두의 싹들이 피어나고 있다. 기어코 봄이다.
16년 전 봄 날, 낮고 비좁은 수원역 구내에는 노숙인들이 모여 있었다. 철로 주변에선 오물과 고약한 냄새까지 났다. IMF 경제 위기로 살던 곳을 떠나와야 했던 나에게 그 풍경은 오히려 친근함으로 다가왔다.
미리 올라와 있던 남편을 기다리던 연무대 앞. 그 곳 급수대에서 만난 주민이 물과 함께 건네주던 격려의 말은 낯선 곳의 두려움을 잊게하는 희망과 용기로 기억되는 풍경이 되었다. 수 없이 많은 스승들을 만나고도 아직 다 깨치지 못한 목숨의 비밀들. "길 위의 학교"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북수동 벽화 골목에서 "팔부자 거리"의 유래에 관한 그림을 보았다.
정조는 시전을 만들어 전국의 상인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거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했다. 해설을 맡으신 김용균 대표님이 "내로라 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두 손 두 발 들게 하는" 오랜 상업의 전통을 느낄 수 있었다.
벽화 속 일꾼은 쉬지않고 벽돌을 쌓고 있었다. "차언노미"로 대변되는 화성축조의 주축을 이뤘던 기술자들의 전통도 현재에 이어져 세련된 기술로 무장한 세계 일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았을까? 수원천 주위로 벚꽃이 지고 있었다. 구부정한 어깨의 노인이 수레를 끌며 지나갔다. 세월을 업은 그의 어깨에 그러나 노동하며 살아온 사람의 당당함이 느껴졌다.
수원천의 콘크리트가 거둬지자 갇혀있던 씨들이 싹을 틔우고 떠났던 생명들이 돌아왔다. 수원천 축대에 기어붙은 담쟁이의 새 잎은 여리고 반질거렸다. 물 속에는 어린 물고기도 보였다. 금방이라도 사냥에 나설 듯 부조 된 청개구리는 눈을 부라렸다. 건너편에서 공사중이던 인부가 양동이를 들고 내려와 물을 퍼 갔다. 남수문을 지나 성곽 위에서 바라 본 팔달산은 꽃구름에 잠겨 있었다. 멀리 보이는 서장대가 홀로 우뚝했다.
도시 재정비 사업으로 지동마을의 일부가 철거될 예정이라고 했다. 서로 닿을 듯 지붕을 맞대고 있는 집들과 굽은 골목 사이로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다래나무가 있는 집의 벽에는 푸른 열매가 주렁주렁 그려져 있었고 분홍 꽃잎은 허름한 담벽위에 무리지어 날아와 있었다.
외지로 나간 자식을 위해 노모는 하얀 쌀밥을 짓고 굴비를 채반에 담아 식구들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조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맞아 가난한 백성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그 날 백성들에게 백성들에게 나눠 줄 음식을 직접 맛보고 공평하게 나눠주는지 신풍루에 올라 지켜보았다고 했다. 누군가와 나누어 먹는 목숨인 밥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벽화 속 어머니를 보며 나 아닌 어머니와 어머니인 나를 만난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버려진 것과 버려둔 것의 의미를 찾아 모여드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고 했다. 봄 꽃 아래서 마냥 흥겨울 수 없는 것은 겨울을 이겨 온 생명의 수고로움을 알기 때문이지 않을까. 서로에게 진 목숨의 빚을 이해하고 살아가라고 꽃잎은 팔랑거리며 하염없이 길 위로 떨어졌다.
글_마영미(수강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