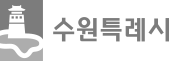수강신청
- 홈
- 수강신청
- 수강후기
수강후기
늦은 저녁강의가 야식보다 맛났다.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살아내기 : 고전읽기]
- 작성자
- 김지선
- 작성일
- 2024.12.02
- 조회수
- 254/2
작년 겨울, 채 운 강사님의 강의를 처음 듣고, 기억력이 감퇴해가는 것을 방치한 채 게으름과 무지에 끌려가는 나를 직시하고 책을 다시 제대로 읽어야겠다고 다짐했었건만! 지켜내기 어려웠고 실패했다.
강의는 백번 들어도 휘발되니 책을 읽어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맘에 남았었는데, 몇번의 시도와 메모 두어번 하고 멈췄었다. 채 운 강사님처럼 공부와 노는 것이 뒤섞여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일과 일상에 쫒겨 살았더랬다.
그래도, 책에 대한 짝사랑은 여전했었는데, 학습관에서 다시 채운 강사님의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살아내기:노년과 죽음에 관한 고전 읽기]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책사랑을 이어갈 에너지를 공급받았다.
지하철로 퇴근하면서 19시 정각에 시작된 강의를 들었다. 강의 시작하기 전 강사님이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으면서 의미있고 기억에 남아 나누고 싶은 문단을 읽어줄 학습자가 있는지 물었고, 두 명의 학습자가 후반부의 이반 일리치의 심정을 읽어주었는데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 기억력이 많이 아쉽지만 그분들의 음성과 나눔이 참좋아서 이후 강의가 더 와닿았다.
익숙한 것들로 둘러싸인 죽음이 아닌, 여인숙.. 길 위에서 생을 마친 작가,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에피소드를 비극이 아닌 누구에게나 있어도 되는 죽음으로 나눈 것도 와닿는다.
소설 후반부의, ‘끝난 건 죽음이야’. 가장 이 소설에서 수수께기 같은 말,, 끝난 건 죽음이야. 죽어가면서 생각한 톨스토이가 이반리치의 입을 빌려 말한 이야기... 이 책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인 ‘죽음’을 탐색하며, 죽음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동시에 삶에 스며들어 있으며, 한계와 모순, 장애라고 생각한 ‘죽음’이 역설적으로 삶의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생생한 긴장과 시적인 직관 속에서 드러나는 찬란한 죽음에 관한 언어들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죽음’을 표현했다.
죽음이 무거운 우울감없이, 인생의 가을과 겨울 이미지 뿐만이 아닌, 찬란한 봄과 싱그럽고 역동적인 여름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그 뭐라도 환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우릭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삶의 의지일텐데, 어쩌면 무수한 죽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삶이 아닐까 한다는 채 운 강사님이 ‘삶과 죽음으로 불면의 밤, 오늘 하룻밤 정도는 고민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보세요~ 모두 잘자지 맙시다, 다음달에 만나요’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위트넘치는 인삿말에 zoom으로 환희 웃은 학습자들이 보였다.
늦은 저녁의 강의가 야식보다 맛났다. 모두 다음달 zoom강의에서 다시 만나리.
강의는 백번 들어도 휘발되니 책을 읽어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한 내용이 맘에 남았었는데, 몇번의 시도와 메모 두어번 하고 멈췄었다. 채 운 강사님처럼 공부와 노는 것이 뒤섞여 있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일과 일상에 쫒겨 살았더랬다.
그래도, 책에 대한 짝사랑은 여전했었는데, 학습관에서 다시 채운 강사님의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살아내기:노년과 죽음에 관한 고전 읽기]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책사랑을 이어갈 에너지를 공급받았다.
지하철로 퇴근하면서 19시 정각에 시작된 강의를 들었다. 강의 시작하기 전 강사님이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으면서 의미있고 기억에 남아 나누고 싶은 문단을 읽어줄 학습자가 있는지 물었고, 두 명의 학습자가 후반부의 이반 일리치의 심정을 읽어주었는데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내 기억력이 많이 아쉽지만 그분들의 음성과 나눔이 참좋아서 이후 강의가 더 와닿았다.
익숙한 것들로 둘러싸인 죽음이 아닌, 여인숙.. 길 위에서 생을 마친 작가, 톨스토이의 죽음에 대한 에피소드를 비극이 아닌 누구에게나 있어도 되는 죽음으로 나눈 것도 와닿는다.
소설 후반부의, ‘끝난 건 죽음이야’. 가장 이 소설에서 수수께기 같은 말,, 끝난 건 죽음이야. 죽어가면서 생각한 톨스토이가 이반리치의 입을 빌려 말한 이야기... 이 책은 ‘형언할 수 없는 것’인 ‘죽음’을 탐색하며, 죽음이 삶을 둘러싸고 있는 동시에 삶에 스며들어 있으며, 한계와 모순, 장애라고 생각한 ‘죽음’이 역설적으로 삶의 조건이 된다고 말했다. 생생한 긴장과 시적인 직관 속에서 드러나는 찬란한 죽음에 관한 언어들은, 내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죽음’을 표현했다.
죽음이 무거운 우울감없이, 인생의 가을과 겨울 이미지 뿐만이 아닌, 찬란한 봄과 싱그럽고 역동적인 여름으로 다가오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다, 그 뭐라도 환대할 수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랄까.
우릭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것 자체가 삶의 의지일텐데, 어쩌면 무수한 죽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 삶이 아닐까 한다는 채 운 강사님이 ‘삶과 죽음으로 불면의 밤, 오늘 하룻밤 정도는 고민하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보세요~ 모두 잘자지 맙시다, 다음달에 만나요’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위트넘치는 인삿말에 zoom으로 환희 웃은 학습자들이 보였다.
늦은 저녁의 강의가 야식보다 맛났다. 모두 다음달 zoom강의에서 다시 만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