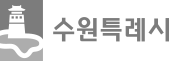수강신청
- 홈
- 수강신청
- 수강후기
수강후기
「모든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북토크
- 작성자
- 박순영
- 작성일
- 2024.10.14
- 조회수
- 446/2
이진민 작가는 이민자로 독일에 살면서 독일의 단어들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가치나 지향점을 이야기한다. 독일사회와 한국사회의 다양한 면모들을 통해 그 이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그러나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현실의 까끌한 부분마저도 막을 살짝 덧씌운 듯 덜 따갑게 느껴졌다. 같은맥락으로 내던져진 존재라는 뜻을 가진‘RAUSWURF’라는 독일단어가 인상적이었다. 독일 유치원에서는 선생님이 졸업하는 아이들을 유치원밖으로 던져주는 문화가 있는데 바닥에 두터운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아두어 아이들이 던져지더라도 푹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인생에 역경이나 고난이 찾아와 아이를 세상에 내동댕이 치더라도 푹신한 매트리스가 그를 지켜줄 것이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혹은 그런 매트리스가 되어주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가 담긴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다.
이진민 작가는 3개의 단어를 추려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FEIERABEND”-축제일의 전야, 일과 후의 자유시간이란 단어였다. 독일인들은 퇴근 후의 삶을 축제처럼 받아들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 여가시간을 철저히 확보하고 알차게 보낸다고 한다.‘서서자는 말’,‘밤새 깨는 소’,‘한쪽 눈 뜨고 자는 새’처럼 한국사회를 묘사하는 말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삶의 방식이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 사회도 이런 인간중심의 담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님의 조용하지만 촘촘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짧게나마 독일의 문화를 경험한 것 같아 무척 흥미로웠다. 우리도 단순히 선진문화를 답습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몸소 체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 강의였다.
이진민 작가는 3개의 단어를 추려 강의를 진행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는 “FEIERABEND”-축제일의 전야, 일과 후의 자유시간이란 단어였다. 독일인들은 퇴근 후의 삶을 축제처럼 받아들이고 가족과의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 여가시간을 철저히 확보하고 알차게 보낸다고 한다.‘서서자는 말’,‘밤새 깨는 소’,‘한쪽 눈 뜨고 자는 새’처럼 한국사회를 묘사하는 말들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삶의 방식이 부러움과 동시에 우리 사회도 이런 인간중심의 담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작가님의 조용하지만 촘촘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짧게나마 독일의 문화를 경험한 것 같아 무척 흥미로웠다. 우리도 단순히 선진문화를 답습하기보다는 그 가치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몸소 체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는 강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