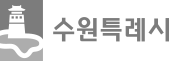수강신청
- 홈
- 수강신청
- 수강후기
수강후기
김종길의 미술관 읽어주는 남자
- 작성자
- 오은숙
- 작성일
- 2013.07.25
- 조회수
- 6370/1

<김종길의 미술관 읽어주는 남자>
“내가 미술에 대해서 물어보면 너는 지금까지 쓰인 모든 미술책에 대해서 속속들이 말하겠지. 미켈란젤로?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 거야. 생애, 업적, 비판, 정치적 열망 같은 거 말이야. 하지만 넌 시스티나성당의 냄새가 어떤지는 말해 줄 수 없지. 거기에 서서 그 아름다운 천장을 올려다본 적이 없으니까.”
영화 <굿 윌 헌팅>에서 숀 맥과이어가 윌 헌팅에게 한 말이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명석한 두뇌를 방패삼아 그 뒤로 숨은 윌의 태도를 꼬집는 말이었다. 하지만 난 그 말의 맥락을 떠나 숀이 말한 ‘시스티나성당의 냄새’가 도대체 어떤지, 영화 보는 내내 언제쯤 시스티나성당에 갈 수 있을까 하며 영화에 집중하지 못하던 우스운 기억이 있다.
그 후, 유럽여행을 갔을 때 몇 군데 미술관을 다녔다. 루브르박물관이라든지 오르세미술관, 우피치미술관 등 유명하다는 미술관엔 꼭 발자국을 찍었다. 그리고 시스티나성당! 드디어 그 시스티나성당에서 <천지창조>를 보게 된 순간, 하지만 난… 난… 숀이 말하던 그 ‘시스티나성당의 냄새’를 느낄 수 없었다. 수많은 인파의 움직임과 체취에 이미 감각들이 마비된 탓이었다. 대신 숀이 말한 고(古) 성당의 서늘한 기운과 독특한 냄새는 이탈리아 밀라노,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교회에서 느낄 수 있었다. 작고 오래된 교회, 그 공기의 특유한 느낌과 냄새 속에서 난 <최후의 만찬>을 아주 황홀히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를 안다는 건 관념적인 인식을 떠나 감각의 느낌이라는 걸 체험한 순간이었다. 그때부터였다. 미술도 모르면서 미술책을 읽어대고, 감상도 못하면서 미술관에 가게 된 건, 그때부터였다. 이번 ‘김종길의 미술관 읽어주는 남자’ 강좌를 듣게 된 것도 그런 연유에서였다. 저 그림에서 뭔가 읽어내고 싶은데 읽어내지 못하는 답답함?!
수업은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번째 시간은 미술관의 탄생에 관해서였다. 미술관이 단지 그림을 전시, 보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림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 보존하며 더 나아가 조사, 연구하여 전시를 하고 교육을 하는 복합적인 곳이란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요즘은 미술관에서도 크고 작은 교육들이 많은 걸 보게 된다.
미술관의 museum은 museion에서 나온 말이라고 한다. 미술관의 어원인 museion은 고대희랍신화에 등장하는 아홉 명의 문예의 여신에게 바치는 전당이란 뜻이다. 아홉 명의 문예의 여신들은 각기 미술, 음악, 문학, 역사, 철학 등 광범위한 지적활동을 맡고 있다. 그러니 미술관은 단지 미술작품만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쌓아 놓은 인문학적인 지식의 보물창고였던 셈이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모두 같은 공간에서 출발한 것이라니, 이제 미술관이 달리 보이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두 번째 시간은 현대미술관의 흐름에 관해서 들을 수 있었다. 특히 21세기 미술관은 창조, 기억, 혁명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다. 요즘은 장르가 파괴되고 문법이라고 믿어 왔던 공식들이 허물어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하셨다. 무용, 음악, 미술, 연극, 영화의 전 장르가 복합적으로 아울러 한 예술작품이 된다. 이러한 예술작품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먼저 작품에는 전경과 후경이 있다고 하셨다. 즉 그림을 볼 때 바로 보이는 전경만이 아니라 그림 뒤편의 후경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현대 예술은 미술의 후경이 판치는 판타지의 세계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는 그림을 볼 때 그 그림의 내면성, 즉 삼차원적인 후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경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정신과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이입된 작가의 창의적인 정신인 것이다. 아마도 내게 예술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러한 작가의 창의적인 정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렇다면 전경 너머의 후경을 볼 수 있는 눈이란 어떻게 길러야 할까? 강사님은 후경까지 볼 수 있는 ‘레시피’는 객관적인 정보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지만, 그 이상 작품의 문을 여는 건 우리의 몫이라 하셨다. 다시 숙제를 안고 가는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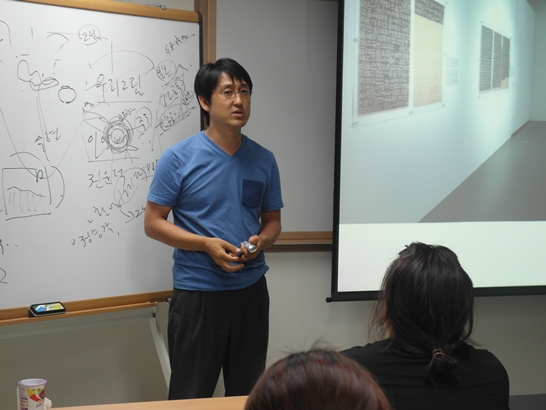
세 번째 시간은 공지된 수업 내용과는 다르게, 강사님이 근무하셨던 경기도미술관에서 전시했던 ‘DMZ 평화미술프로젝트’를 소개해 주셨다. 큐레이터가 어떤 기획의도로 전시를 기획했으며, 어떻게 전시가 이루어지는지, 작가를 섭외하고 큐레이팅하는 일련의 절차들을 알려 주셨다.
사실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어왔던 나도 책을 볼 때면 “편집자는 어떤 의도로 이 책을 기획했을까?” “이렇게 편집한 편집자의 의도는 뭘까?” “출판사는 왜 이 책을 출판한 걸까?”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강사님은 전시를 볼 때 전시 그 자체만이 아니라 큐레이터의 기획 의도를 유추해 보라고 하셨다. 큐레이터의 기획된 의도를 찾는 즐거움! 이제 미술관에 가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요소를 하나 더 찾은 기분이다.
얼마 전, 서울 부암동에 있는 환기미술관에 다녀왔다. 김환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전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시詩정신이오.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야 할 것 같소.”라던 김환기의 표현처럼 모든 예술에는 노래가 담겨 있다. 이젠 그 노래를 찾는 작업을 아주 즐겁고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리고 그 노래란 곧 ‘시스티나성당의 냄새’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자, 이제 미술관에 가보자!
글_오은숙(수원시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 실습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