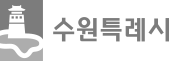수강신청
- 홈
- 수강신청
- 수강후기
수강후기
[다정노트] 퀼트로 힐링해요(누구나학교 퀼트단지 분투기)
- 작성자
- 박순옥
- 작성일
- 2022.02.08
- 조회수
- 1734/2

학습관 [다정노트] 연재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학습관이 문을 닫았던 동안에도 시민들의 배움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혹은 학습관 밖에서 소규모로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매우 답답하고 서로의 안부가 궁금한 날들이었어요. 그 마음을 담아 학습관 사람들의 소식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다정노트]란 이름으로 전합니다. 팬데믹 기간 우리들의 배움과 일상의 분투를만날 수 있습니다. #[다정노트]를 연재하는 시민기획단 나침반은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책을 읽고 토론하며저자를 만나고 강연을 기획합니다. 만남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또 다른 시민과 나눕니다. ========================================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 <누구나학교>에서 수업하는 ‘퀼트 단지’는 2017년 8월 휴대폰 케이스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 그 뒤로 지갑, 가방, 선글라스케이스, 파우치, 필통, 냉장고 덮개, 조끼, 노트북가방, 대형 샘플러 이불 등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주로 만들었다. 2019년 12월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바로 직전에 그동안 작업한 것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다. 그중에 1년 동안 만든 대형 샘플러 이불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이불은 가로 20cm, 세로 20cm 인 조각 패턴을 56개 만들고 이것을 다른 원단과 이어 붙여서 만든 작품으로 가로 196cm, 세로 220cm 의 대형 작품이다. 목화솜을 넣고 퀼팅(누비는 과정)을 하며 바늘에 찔리기도 하고 굳은살도 베기는 순탄치 않은 작업이었다. 혼자서 이 크기의 이불을 만든다면 지쳐서 포기했을 지도 모른다. 아니, 애초에 만들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퀼트 단지’의 멤버들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용기가 생겼다. 바느질을 하며 나누는 이야기는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생활 등등.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곁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는 시간은 소중하고 행복하다. ‘목마’는 대형 이불을 완성하고, 미국에 사는 손녀(5세) 이불(아동사이즈)까지 만들어 보냈다. 그녀는 다작의 여왕으로 많은 작품을 친구나 친척에게 선물한다. 퀼트를 하지 않았다면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퀼트사랑을 자주 말한다. ‘수수’는 보트와 비행기 패턴을 좋아한다. “퀼트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좋은 것이 있으면 서로 나누고 싶잖아요. 퀼트도 그래요.”라는 말을 해서 항상 힘이 난다. ‘오드리’는 바쁜 중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는 분위기메이커이다. 레몬스타 패턴으로 만든 김치냉장고 덮개는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진다고 한다. 중년의 나이에 같은 취미를 갖고 힐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며 행복이다. 그동안 학습관은 방역 지침에 따라 문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했다. 같이 모여 바느질 할 곳이 없었던 우리는 카페를 터전 삼아 바느질을 했다. 학습관에는 다리미와 다리미대가 준비되어 있고 작은 싱크대도 마련되어 있어서 원단을 선세탁 해야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원단 조각을 이어 붙여 원하는 패턴을 만들고 나서는 시접을 정리해야 한다. 이때 다리미가 꼭 필요하다. 준비되어 있는 다리미와 다리미대는 유용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카페에서 퀼트모임을 할 때, 다림질을 해야 하는 것은 집에서 미리 다려 와야 했다. 작업 과정상 다림질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작업을 멈추어야 한다. 그래서 다림질이 필요한 작품은 그동안 하지 못하고 바느질만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 위주로 작업을 했다. 아무래도 제한적이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재미가 덜했다. 지금은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이 문을 열어서 퀼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소의 소중함을 코로나19로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 나에게 퀼트는 삶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하고 나를 위한 시간이 없어지고 모든 생활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의 엄마로서 책임감이 삶의 목표 같았다. 이런 생활이 둘째를 낳고도 계속 되었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사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 없이 세월은 흘렀다. 생활은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 집중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견디는 쳇바퀴 인생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첫 아이가 고학년이 되자 차츰 나의 생활을 찾고 싶어졌다. 그때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의 문화센터를 기웃거렸다.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퀼트 작품들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한참동안 넋을 잃고 보곤 했었다. 그 귀엽고 예쁜 것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미소가 번졌다. 퀼트가 사막 같은 마음에 단비였던가 보다. 갖고 싶었던 것들이 많았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해 졌다. 몇 년 동안 흠모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퀼트를 배우게 되었다. 처음엔 단순히 예쁘고 귀여운 것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바느질을 하다 보니 다른 매력을 알게 되었다. 원단을 잘라 바느질을 해서 무언가 쓸모 있는 것을 만드는 작업 자체에 큰 성취감이 생겼던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내 손으로 만든 다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었고, 완성작을 가지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도 즐거웠다. 그리고 내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완성된 작품이 아름답기까지 했다. 아름답고 쓸모 있는 것을 보니 삶이 풍요로워졌다. 생활에 지쳐서 생기를 잃었을 때나, 스트레스로 마음이 엉망일 때, 혹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우울할 때. SNS로 누군가가 만든 퀼트 작품들을 보면 생기가 돌면서 힘이 났다. 예쁜 퀼트 작품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벌떡 일어나게 되는 마법이 일어났다. 그중에 가장 좋았던 점은, 손으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해야 완성되는 것이기에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것이다. 느리게 흐르는 시간 동안 나의 지난 언행을 복귀하게 되었다. 나를 반성도 하게 되었고 ‘나는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변했다. 바느질을 할수록 사유 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고 내면이 성장하는 걸 느꼈다. 사유를 하게 되니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궁금한 것들이 생기고 책을 찾아 읽게 되는 시간도 늘어났다. 그때 읽은 책들 중 제클린 우드슨의 『엄마가 수놓은 길』이라는 동화책이 있다. 퀼트 조각 패턴과 함께 노예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글을 읽고 쓸 수 없었던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 모르게 퀼트를 활용한 조각보로 지도를 만들었고, 노예들은 그 퀼트 조각보를 나침반 삼아 탈출을 했다. 미국의 남북 전쟁 때 흑인 노예들에게 퀼트는 생명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퀼트는 나의 삶에도 길잡이 역할을 한 것 같다. 퀼트단지 강사 박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