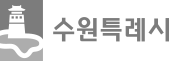수강신청
- 홈
- 수강신청
- 수강후기
수강후기
글을 쓰든 짓든, 일단 써!
- 작성자
- 이명선
- 작성일
- 2016.05.11
- 조회수
- 6135/1

malonetta birth control
malonetta generation malonetta uden pause malonetta 90<시민기자학교: 칼럼 쓰기> 후기
글에 관점을 담고 밀도를 채울 때
뭘 말해?
“다음 ‘청년실업, 더 뭘 바라겠는가?’ 이*선 씨 글인가요?”
“네, 전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여기서도 비슷하네요. 씨앗(핵심)문장은 대학 학자금 반값으로 하겠다는 공약만 지키면 된다, 이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 글의 핵심이 모일 수 있도록 재구성을 해보는 게 필요하죠. 밀도 있는 짜임 말이죠. 시작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이러니저러니 하다가 이것만 지켜라 하는 리포트 구성, 흔히들 하는 방식이지요. 밀도 있는 글이란 시작부터 그 말을 하고자 하는 요소들이 모여야 합니다. 상관관계에 있는 것들이 등장해야 하는데 무관한 느낌의 글들이 병렬식으로 병치된 느낌입니다. 청년실업에 대해 쓰라면서요?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지요. 그 안에 청년실업의 의미만 담겨 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만 있으면요.”
“구체적이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개념을 정확히 몰랐다는 이야기인가요? 주제를 처음 받았을 때 총론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요?”
“언급만 하면 돼요. 이런저런 단상들을 쓰다가 결론으로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쓰는 유형의 글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지요. 남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왜 그걸 중요시 여기는지, 남다른 체험, 남다른 사례, 남다른 설득력 등을 쓰라는 겁니다. 대안이요? 뻔한 데 어떤 걸 제시하겠어요.”
여러 번 덧칠을 했던 글이 깨진다. 옆집에 갈 때도 순서가 있는데, 하물며 글을 배워 써보고 싶다는 사람이 억지를 부린다. 주어진 과제물을 보고 저울질 없이 ‘청년실업’을 택했다. 특별한 제재 없이도 관점만 새롭다면 재미있는 글이 나온다는 지난 강의 내용이 둥둥 떠다녔지만 무조건 손가락을 움직였다. 일단 출발부터 했다. 빨간 신호등이 보이지만 익숙함에 길들여진 손가락은 예전보다 성능이 더 좋다.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의문이 들었으나 으레 그래왔던 편안함에 빠졌다. 방만한 글은 주제의 허울에 가려 진정 하고자 했던 ‘내 이야기’가 빠진 그럴싸한 껍데기만 남았다. 인정하기 싫지만.
‘칼럼’, 넌 정체가 뭐니?
이름이 주는 그럴싸함에 속아 폼 나는 글 좀 써보자 했다. 오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묻는다. 그냥 뭐 그저 그런, 놀지는 않는다는 뒷부분 소리만 요란하다. 어떤 일을 하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다. 자신감이 바닥이다. 다시 이어지는 질문, 요즘 뭐 배우냐고? 음, 칼럼 쓰기. 얼마나 폼 나는 대답인가. 아무나 못 쓰는 칼럼이란 걸 배운다. 가르쳐주는 곳도 흔치 않다. 칼럼을 쓰든 말든 상관없다. 배운다는 것만 중요하다. 목적은 이거다. ‘그저 칼럼 쓰기를 배운다.’
허우대만 신경 쓰다 본질을 잊었다. 칼럼이 뭐더라? 분명 알긴 아는데 얘야말로 명확한 정의가 없네. 글의 갈래로 보면? 또 나온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이건 심각한 병이다. 주입식 교육에 암기식 답, 참 편하게 공부한 티가 난다. 경계가 모호하면 어떤가. 그저 읽는 이들에게 공감을 주고 재미를 주면 되는 거지. 잠깐, 재미있는 글은 수준이 낮고 어려우면 안 보는 영리한 읽기의 달인들 입맛도 생각해야 되는데... 칼럼, 넌 역시나 만만치 않다.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으니.
한참을 두 개의 자아가 대립하는 모습이 안쓰러운지 시민기자학교 칼럼 쓰기 임범 선생이 정의를 내려준다.
사물의 새로운 면을 관찰하고(탐구),
낯익은 것에서 낯선 것을 발견하고(반성),
확신과 맹신의 오류를 물리치고(의심),
세상의 부조리와 게으름에 맞서고(저항),
새롭고 적확한 표현을 통해 세상 인식을 확장시키는(고양) 일.
글을 쓰든 짓든, 일단 써
제일하기 싫은 일이 글쓰기다. 가장 잘 하고 싶은 일도 글쓰기다. 그것도 아주 잘 쓰고 싶다. 누구나 갖는 내면의 욕구라 하니 이해는 간다. 그럼에도 이놈의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쓰고 싶은 대로 나오면 좋겠는데 안 된다. 뜸들이고, 무능력자로 자책하게 만든다. 욕구라도 조용하면 좋겠는데 쉬지도 않는다. ‘ 안에 할 이야기가 많이 들어서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남의 글처럼 내 글이 쉬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자기가 쓴 것은 동사 같은 뚜렷한 말에서도 그 잘못된 것을 얼른 집어내지 못하면서 남의 글에서는 부사 하나 덜 된 것이라도 이내 눈에 걸리어 그냥 지나쳐지지 않는다.” 이태준 작가가 말했단다. 그럼 약간의 희망은 보인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어렵다.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렇다네. 그럼 해볼 만하잖아. 해볼까? 희망을 가져도 되겠지. 그럼 언제 시작하지? 다음에, 나중에, 배우고, 알게 되면 또 들려오는 낯익은 소리다. 다른 말도 들린다. 정답을 찾지 말고 그냥 써. 자기를 들여다봐, 그러면 자신의 느낌이 와. 구체적으로 보여주면 돼. 그냥 지금 써, 없는 답 찾으려고 애쓰지 마, 해봐.
여전히 설명이 편하고, 보여주기가 안 된다. 대신 장황한 변명을 할 줄 아는 뻔뻔함이 생기나보다. 필통이 빈가방 안에서 요란스레 달음질치니 괜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