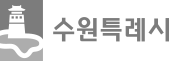수강신청
- 홈
- 수강신청
- 수강후기
수강후기
3월 열린극장 자전거 탄 소년 후기-페달을 힘차게 구르며 나아가는 아이
- 작성자
- 이명선
- 작성일
- 2015.04.01
- 조회수
- 6756/1

마을 열린 극장 <자전거 탄 소년> 후기
페달을 힘차게 구르며 나아가는 아이
페달을 힘차게 구르며 나아가는 아이
어슬어슬~ 도둑괭이처럼 다가오더니만 어느새 꽃비가 내리는 봄이다. 초록물이 가지 끝에 조금씩 묻어나더
니 조물거리는 입 모양새로 목련의 꽃망울도 부풀고 있다. 노란 물감 툭툭 던져놓은 개나리, 보랏빛으로 바
닥을 달구어놓는 꽃잔디 등 봄의 계절을 빌린 공간은 꽃천지다.
몽실 대는 꽃들의 향연과 달리 꼬불거리는 지렁이 한 마리 머리에 들어온 듯 진종일 어지럽다. 시린 칼바람도
아니건만 찬 기운이 묻어나는 봄바람에 수분 빠진 무말랭이처럼 피곤하다. 의자에 등만 닿으면 잠이 쏟아진
다. 오전 교육을 듣는 시간에도 눈꺼풀에 달라붙은 잠에 취해 몇 번이고 고개를 흔들다 내가 놀라서 깨어나길
몇 번, 이 무슨 조화인지 알 수가 없다. 알싸한 꽃 맛에 취해서인지, 나른해지는 봄의 기운이 내게로 쏠린 것인
지 마음에 분홍빛이 들기도 전에 나른함이 먼저 찾아오는 속내처럼 평생학습관의 마을 열린 극장에 손님이 별
로 없다. 봄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라 그런가.
봄날의 고요한 반란을 기대하며 시선이 영상 속의 아이에게 머문다. 아이는 두 입술을 앙다문 채 전화기를
잡고 있다. “전화 끊어, 없는 번호라고 나오니 끊어.” 날선 말이 들려오지만 아이는 초조함을 누른 채 몇 번
이고 전화를 다시 건다. 전화기를 빼앗는 사람을 피해 아빠가 있던 집으로 도망치듯 간다. 아빠가 자신에게
말도 없이 이사를 갔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고, 자신의 자전거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사실도 믿을 수
없다. 잠시만 보육원에 맡겨진 것이란 아빠의 말을 믿으며 아빠를 기다렸다.
그런데 12살의 아이가 감당하기엔 무거운 현실이다. 무미건조하게 그려지는 작은 그림자가 담담하게
시릴의 눈높이에서 그려진다. 시릴의 분노와 슬픔은 숨을 죽이고 있다.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자전거를
찾아다주는 미용사 아줌마 사만다와 자신의 위탁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시릴에겐 과장된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어찌 저리 무심할 수 있는지 우리 정서와 조금은 동떨어진 느낌마저 들었다. 아니, 오히려
그 점이 이영화가 가진 매력이다. 눈물 나게 신파적이지 않으면서 감정의 사치를 부리지 않는다. 요즘 표현
으로 하면 한마디로 쿨하다.
시릴의 주근깨 가득한 얼굴 위로 감정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그저 아이의 거친 호흡과 자전거에 대한
집착과 자전거가 자신의 일부인양 신기에 가까운 재주를 부리는 모습만 보인다. 반항기 가득한 청춘의
시기에 믿을 수 없는 어른과 달리 자신에게 다가오는 동네 불량배 형이 시키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며
그에게 기대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시릴의 마음이 읽혀진다.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가족인
아빠마저 자신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하고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조건 없이 자신을
위해주는 사만다를 믿을 수 있을까?
자신의 처지를 말로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향해 시릴은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 말리는 사람
들을 피해 도망을 가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리춤에 매달리며 몸으로 저항을 표출한다. 그러나 누구도
따스한 시선이 아니라 그냥 감당해내야 하는 숙명처럼 받아들이길 바란다. 아프겠다는 위로의 시선과 말이
아닌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하길 원하는 모습은 아이의 감정을 헤아림에 익숙하지 않은 타자의 시선으로
그려낸다.
감독은 이렇게 무심하게 보여준다. 아버지에게 훔친 돈을 가져다주며 자신이 잡히더라도 절대 말하지 않을
테니 그 돈을 쓰라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누구를 감옥에 보내려 하냐며 돈과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던진다.
그 속에는 세상의 따스함이 없다. 그럼에도 아빠를 욕할 수 없고, 아이가 무조건 불쌍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삶도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충분히 안쓰럽고 불쌍하지만 내 사는 세상이 그리 편치 않다. 녹록함이
많고 팍팍한 일상이 되다보니 다른 이의 아픔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다. 그저 내게 손해가 오지 않는다면
관심조차 두고 싶지 않을 정도로 시릴의 세상이나 내가 사는 세상이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차가운 시선으로 영화를 바라보지 않게 된다. 큰 몸짓은 아니지만 온기를 담은 따스함이 담겨
있음이 느껴진다. 잔잔하지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사만다가 있기 때문이다. 혈연을 맺지 않은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으며, 인간관계의 사회구조가 혼자선 살 수 없으며 누군가와 함께 나눌 때 행복함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지만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사만다를
위해 더 이상 악과 손잡지 않는 당찬 시릴이 있고, 무한한 사랑을 주면서도 호들갑스레 표현하지 않는
과묵한 사랑을 하는 사만다가 있기 때문이다.
영화에서 가장 좋았던 세 장면을 뽑는다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던 시릴이 아줌마 찔러서 미안
하다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과 엄마와 아들처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그들만의 소풍을 떠나는 장면,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며 한 손에 숯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마지막 장면이다.
유명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했다는 영화라는 소개보다 자전거 페달에 힘을 주며 앞으로 나가는 시릴의
성장영화란 소개가 더 와 닿는다.
수원평생학습관의 마을 열린 극장에선 4월 10일 금요일 오후 2시 영상 강의실에서 정대건 감독의 <투올드
힙합 키드> 영화가 기다리고 있다.